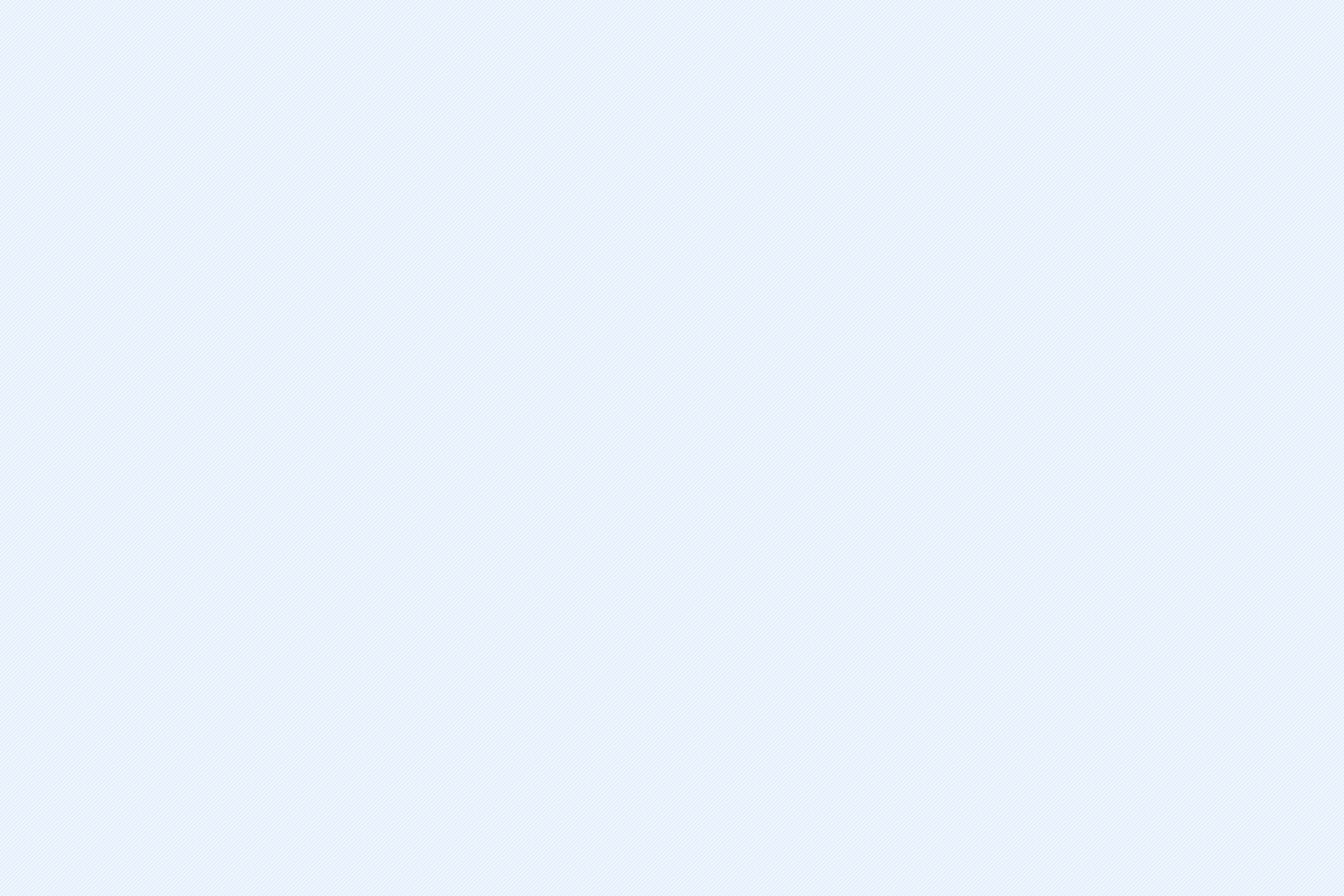주선애 교수 간증(34)
작성자
신영삼
작성일
2019-07-25 15:44
조회
145
굶주린 동포 도움 구하려 망명했으나 희생된 식구·제자에 대한 죄책감 심해

주선애 장로회신학대 명예교수를 ‘한국 자매’라고 불러줬던 새뮤얼 모펫(Samuel Moffett) 선교사 부부의 2003년 모습.
황장엽 선생님은 2003년 다음과 같은 글을 적어 빈 그릇과 함께 내게 건네주셨다. ‘주선애 선생께. 4월 20일은 망명 6년이 되는 날입니다. 답답한 심정을 적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신을 가다듬고 길을 찾아야 한다. 길을 꼭 찾아야 한다. 미련 없이 떠나갈 수 있는 마지막 길을, 생명을 주고받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내게 인생을 안겨준 ‘위대한 어버이’께 바치는 감사와 속죄의 정성 다하여 끝까지 싸우다 싸움터에서 이 세상 하직하고 갈밖에 다른 길은 없을 터.’2003년 4월 23일 탈북자동지회 사무실 문밖에 피 묻은 글과 칼이 꽂힌 장면이 신문에 났다. 나도 놀랐지만 많은 사람이 놀랐을 것이다. 그러나 선생님은 평온한 듯 아무 말도 안 했다. 실상 그는 죽고 싶다는 말을 때때로 하시곤 했다. 항상 칼을 허리에 차고 다닌다며 보여준 일도 있었다.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국정원에 황 선생님을 만나러 갔을 때였다. 방 안에 들어갔더니 아무도 없었다. 황 선생님이 갑자기 접이칼을 들고 나타나 죽겠다고 했다. 나는 너무 놀라고 당황해 큰소리를 질렀다. “뭐 지도자가 이따위야!”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소리였다. 그는 칼을 책상 위에 놓으며 주저앉아 버렸다. 나는 그 이유를 묻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고뇌는 조금 이해가 갔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 생각하고 황 선생님의 신앙을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우리 시대에 다시 찾을 수 없는 애국자로 역사에 길이 남아야 할 분이었다. 북에서 남으로 오게 된 것은 남한으로 가라는, 자신의 양심으로부터 나오는 강한 명령 때문이었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다. 북한 노동당 비서로서 600만명이나 굶주려 죽었다는 것을 알고, 마음으로 큰 고민을 하다가 남한의 도움을 구해볼 생각으로 왔다고 했다. 그러나 식구들뿐 아니라 자신의 제자들까지 희생시켰다는 죄책감으로 마음의 고통이 무척 심했다.
나는 오랜 친구 선교사이자 장로회신학대 동료 교수인 새뮤얼 모펫(Samuel H Moffett·한국명 마삼락) 내외에게 황 선생님을 방문하도록 청했다. 그분들은 기꺼이 수락했고 꽃다발을 들고 찾아갔다. 꽃다발을 드리며 정중히 인사했더니 황 선생님은 “나 같은 죄인이 무슨 꽃다발입니까” 하며 받기를 거절하다가 할 수 없이 “주 선생이나 하시오”라며 내게 건네셨다.
모펫 선교사의 기도를 들은 황 선생님은, 옛날 자기가 어렸을 때 어느 선교사가 집에 와서 복음을 전해준 기억이 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손으로 책상머리를 짚고 옮겨 가면서 “사람이 이렇게 살아요. 그리고 죽어요” 하며 책상에서 손을 밑으로 하고 그다음 손을 위로 향하면서 “죽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요. 이것만으로도 표현이 잘 되지요”라고 말씀하셨다. 정말 복음을 간단명료하게 표현해 보여줬다. 어린 시절 그의 기억에 남아 있던 간결한 복음이 불현듯 떠올랐던 것이다. 그렇게 잠겨 있던 복음을 떠오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정리=최기영 기자 ky710@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