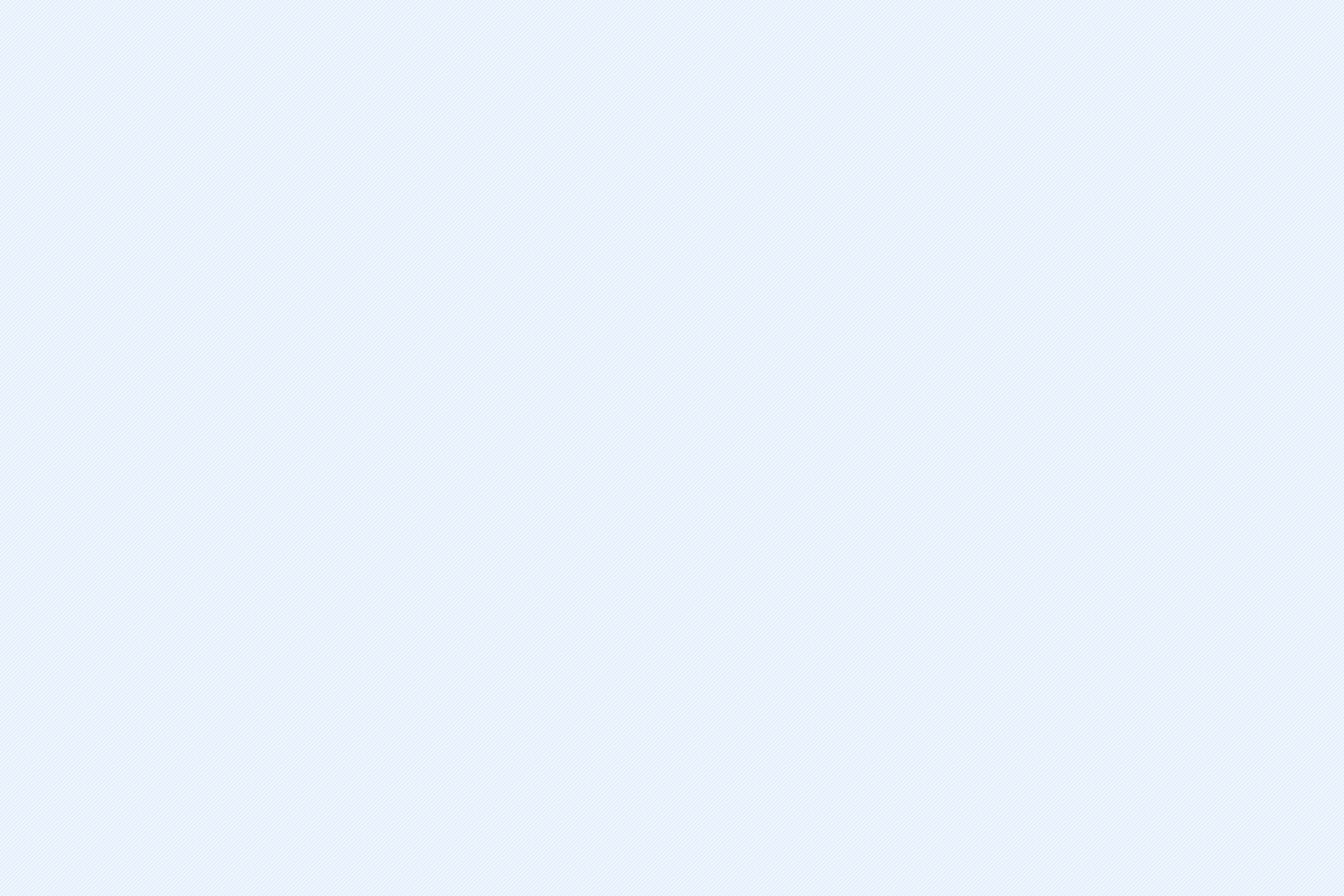가수 남진의 간증(15)
작성자
신영삼
작성일
2019-03-07 11:44
조회
81
남진 (15) 시대의 애환 담은 ‘임과 함께’… ‘국민가수’ 명성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님과 한 백년 살고 싶어.”
1971년부터 3년 연속 MBC 인기가수상을 받는 데 큰 역할을 한 ‘임과 함께’ 가사 중 일부다. 당시는 산업화 시대였다. 돈을 벌기 위해 고향을 떠나 공단에서 일하는 이가 많았다. 그림 같은 기와집에 살고 싶다는 민초들의 염원이 노래에 담긴 것이다.
작사가 고향씨는 부산 출신이다. 기차를 타고 부산에 가면서 밖을 보니 어수룩한 초가집과 양철집이 많았다. 반면 서울에는 산업화 덕에 근사한 기와집이 많았다. 그런 집을 푸른 초원 위에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가요는 시대를 반영한다. 몇 년도 가요라고 하면 그때의 시대상이 드러나야 좋은 가요다.
“울려고 내가 왔나 누굴 찾아 나 여기 왔나 낯설은 타향 땅에 내가 왜 왔나.”(‘울려고 내가 왔나’ 중)
1966년 발매한 나의 첫 히트곡인 ‘울려고 내가 왔나’도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노래다. 비는 내려 처량한데 고향에 두고 온 부모님과 애인이 문득 생각난다는 내용이다. 낯선 타향에서 객지 생활을 한 사람이 많았던 시대에 이 곡은 호소력이 있었다. 돈을 벌기 위해 서울에 온 사람, 군에 입대한 사람 등 모두가 이 노래를 불렀다. 타향살이는 서글프고 힘들다. 그때는 타향살이하는 사람이 참 많았다.
시대를 대변하는 노래를 부른 나를 방송에선 ‘국민가수’ ‘가요계의 대부’ ‘가왕’이라 표현했다. 하지만 나는 그런 칭찬이 다소 유치하게 들린다. 진짜 국민가수는 현인 선배다. 내가 대여섯 살 때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라는 가사를 담은 ‘전우야 잘 자라’는 전 국민이 불렀다.
일본에선 ‘가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표현이다. 어떻게 가수의 왕이 있을 수 있는가. 가수마다 음색이 다르고 나름의 스타일이 있는 법이다. 누가 최고라고 할 수 없다. 그보다 ‘오빠 부대의 원조’라는 별명이 나는 좋다.
한국에선 유독 ‘트로트 가수’라는 표현도 많이 쓴다. 트로트 가수라며 무시하는 경향도 있다. 하지만 트로트라는 리듬은 엄연히 재즈 맘보 도돔바 등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리듬 중 하나다. 내가 부른 노래 대부분은 트로트가 아니다. 나에겐 트로트 가수보다 ‘가요 가수’라는 표현이 맞지 않나 싶다. 더 엄밀히 표현하자면 ‘대중가요 가수’다. 일본에선 트로트 가수라는 말을 쓰지 않고 ‘엔카 가수’라 한다.
트로트는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리듬이다. 일본인들이 그 리듬을 엔카라며 따라 불렀다. 그게 일제강점기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광복이 되며 방송에서 엔카를 트로트라 부르며 말만 바꿨다.
옛날 노래를 전부 트로트라 지칭하기도 한다. 하지만 엔카는 엄연히 일제 시절 시작된 노래 리듬이지 우리의 전통음악이 아니다. 우리 전통음악은 민요다. ‘가슴 아프게 울려고 내가 왔나’는 트로트 리듬이다. 하지만 나의 다른 많은 곡은 고고 디스코 트위스트 리듬이다. 엄연히 리듬이 다르다.
예로 ‘마음이 고와야지’는 트위스트다. 그 곡으로 우리나라 최초로 가수가 노래를 부르며 춤을 췄다. 요즘엔 방탄소년단(BTS)이 무용수보다 춤을 더 잘 춘다. 지금은 그런 시대다. 옛날에는 춤은 무용수가, 노래는 가수가 불렀다. 시대가 달라졌다. 가요 전체를 어느 하나로 특징지을 수는 없다.
정리=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MBC 인기가수상 3년 연속 수상…
히트곡 대부분 ‘트로트’ 아냐, ‘대중가요 가수’로 불리는 게 맞아

남진 장로가 1972년 발표한 ‘임과 함께’ 앨범의 표지. ‘임과 함께’는 산업화 시대 타향살이의 아픔을 담은 노래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님과 한 백년 살고 싶어.”
1971년부터 3년 연속 MBC 인기가수상을 받는 데 큰 역할을 한 ‘임과 함께’ 가사 중 일부다. 당시는 산업화 시대였다. 돈을 벌기 위해 고향을 떠나 공단에서 일하는 이가 많았다. 그림 같은 기와집에 살고 싶다는 민초들의 염원이 노래에 담긴 것이다.
작사가 고향씨는 부산 출신이다. 기차를 타고 부산에 가면서 밖을 보니 어수룩한 초가집과 양철집이 많았다. 반면 서울에는 산업화 덕에 근사한 기와집이 많았다. 그런 집을 푸른 초원 위에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가요는 시대를 반영한다. 몇 년도 가요라고 하면 그때의 시대상이 드러나야 좋은 가요다.
“울려고 내가 왔나 누굴 찾아 나 여기 왔나 낯설은 타향 땅에 내가 왜 왔나.”(‘울려고 내가 왔나’ 중)
1966년 발매한 나의 첫 히트곡인 ‘울려고 내가 왔나’도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노래다. 비는 내려 처량한데 고향에 두고 온 부모님과 애인이 문득 생각난다는 내용이다. 낯선 타향에서 객지 생활을 한 사람이 많았던 시대에 이 곡은 호소력이 있었다. 돈을 벌기 위해 서울에 온 사람, 군에 입대한 사람 등 모두가 이 노래를 불렀다. 타향살이는 서글프고 힘들다. 그때는 타향살이하는 사람이 참 많았다.
시대를 대변하는 노래를 부른 나를 방송에선 ‘국민가수’ ‘가요계의 대부’ ‘가왕’이라 표현했다. 하지만 나는 그런 칭찬이 다소 유치하게 들린다. 진짜 국민가수는 현인 선배다. 내가 대여섯 살 때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라는 가사를 담은 ‘전우야 잘 자라’는 전 국민이 불렀다.
일본에선 ‘가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표현이다. 어떻게 가수의 왕이 있을 수 있는가. 가수마다 음색이 다르고 나름의 스타일이 있는 법이다. 누가 최고라고 할 수 없다. 그보다 ‘오빠 부대의 원조’라는 별명이 나는 좋다.
한국에선 유독 ‘트로트 가수’라는 표현도 많이 쓴다. 트로트 가수라며 무시하는 경향도 있다. 하지만 트로트라는 리듬은 엄연히 재즈 맘보 도돔바 등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리듬 중 하나다. 내가 부른 노래 대부분은 트로트가 아니다. 나에겐 트로트 가수보다 ‘가요 가수’라는 표현이 맞지 않나 싶다. 더 엄밀히 표현하자면 ‘대중가요 가수’다. 일본에선 트로트 가수라는 말을 쓰지 않고 ‘엔카 가수’라 한다.
트로트는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리듬이다. 일본인들이 그 리듬을 엔카라며 따라 불렀다. 그게 일제강점기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광복이 되며 방송에서 엔카를 트로트라 부르며 말만 바꿨다.
옛날 노래를 전부 트로트라 지칭하기도 한다. 하지만 엔카는 엄연히 일제 시절 시작된 노래 리듬이지 우리의 전통음악이 아니다. 우리 전통음악은 민요다. ‘가슴 아프게 울려고 내가 왔나’는 트로트 리듬이다. 하지만 나의 다른 많은 곡은 고고 디스코 트위스트 리듬이다. 엄연히 리듬이 다르다.
예로 ‘마음이 고와야지’는 트위스트다. 그 곡으로 우리나라 최초로 가수가 노래를 부르며 춤을 췄다. 요즘엔 방탄소년단(BTS)이 무용수보다 춤을 더 잘 춘다. 지금은 그런 시대다. 옛날에는 춤은 무용수가, 노래는 가수가 불렀다. 시대가 달라졌다. 가요 전체를 어느 하나로 특징지을 수는 없다.
정리=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