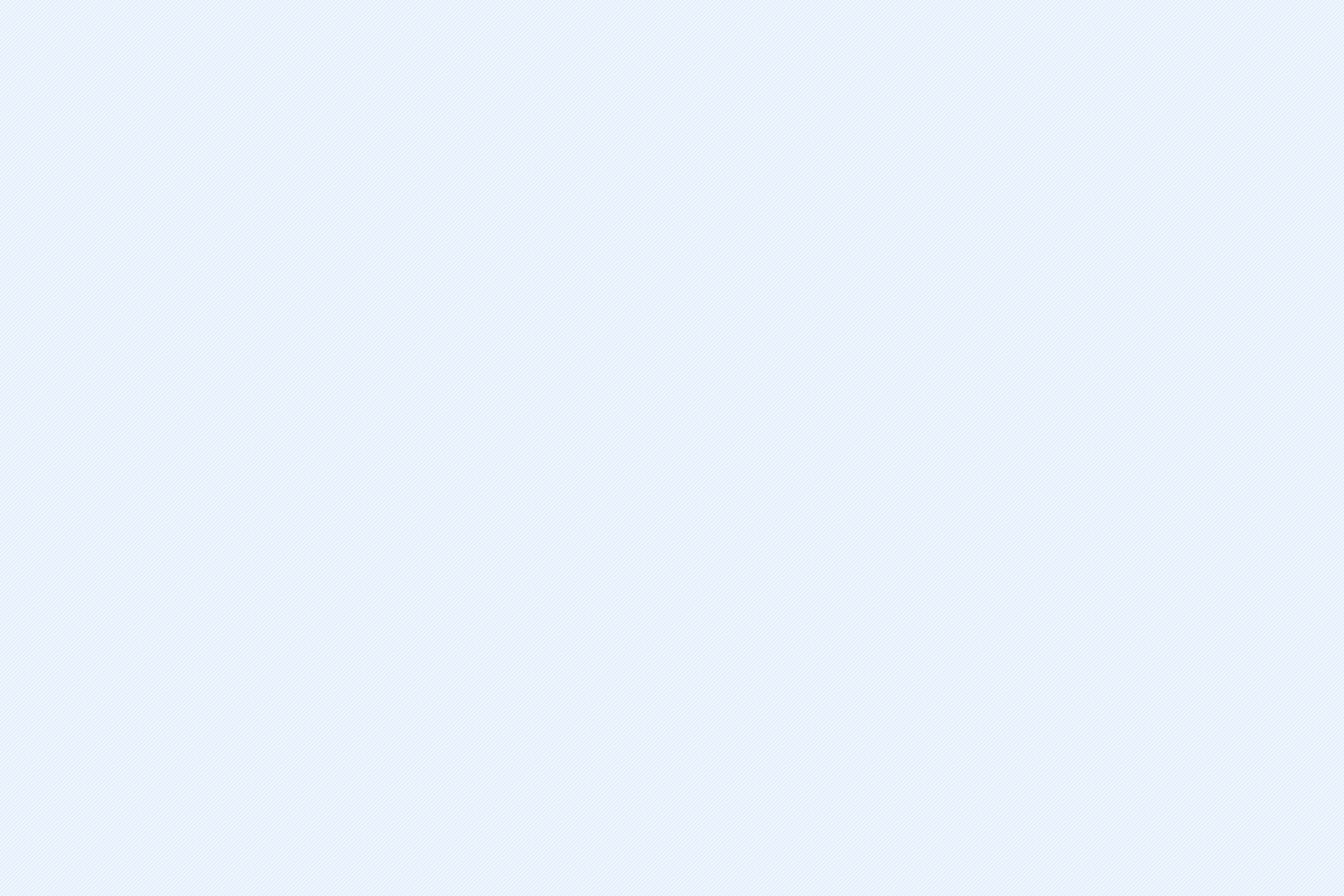주선애 교수 간증(11)
작성자
신영삼
작성일
2019-06-24 15:31
조회
69
주선애 (11) 고달파도 슬프지는 않았던 남산 해방촌 기숙사
남산 해방촌엔 유달리 북한 사람이 많이 살았다. 이북에서 피난 온 대학생들에게 무료로 숙식을 제공하는 ‘송죽원’이란 학사가 생겨 그곳에서 생활하게 됐다. 건물은 꽤 컸지만, 난방이 안 됐고 전기도 들어왔다 나가기를 반복했다. 한겨울에도 미군들이 쓰던 매트리스 한 개에 두 사람이 같이 누워 잤다. 너무 추워 견디기 힘들 때 조금 따뜻하게 자는 방법이 있었다. 두 사람이 등을 맞대고 반대로 누워 내 발은 옆 사람의 겨드랑이 밑에, 옆 사람의 발은 내 겨드랑이에 감싸고 자면 발에 따뜻한 기운이 돌아 잠이 잘 왔다.
장로회신학교 여학생들은 공부하느라 바빴다. 북한에선 영어를 배우지 못했는데 영어는 필수였고 헬라어 히브리어도 해야 하니 도통 정신이 없었다. 무료로 제공되는 식사는 아침저녁으로 나오는 죽 한 그릇이 전부였다. 영양 상태가 좋을 리 만무했다.
전기가 안 들어오는 밤에 공부하려면 빈 잉크병에 석유를 담아 솜이나 헝겊으로 심지를 만들어 불을 켰다. 그렇게 펄럭거리는 뿌연 불 밑에서 매트리스를 깔고 공부했다. 담요를 뒤집어쓰고 책을 읽노라면 졸음이 몰려와 꾸벅꾸벅 졸다가 불에 닿아 머리카락을 태우는 일도 다반사였다.
늘 허기지고 피곤한 상태였지만 피난민 여학생들은 금요일 저녁마다 6~7명씩 모여 철야기도를 했다. 기도처는 기숙사 인근 충무로교회였다. 기숙사는 밤 10시만 되면 사감 선생님의 점검이 있었다. 선생님의 최우선 임무는 10시 이후 아무도 나갈 수 없도록 커다란 대문을 굳게 잠그는 일이었다.
담장은 높고 육중한 대문은 안쪽에서 열 수 없게 잠겨 있었다. 사감 선생님의 점검이 끝난 후 몰래 모인 우리는 현관문 밖으로 나왔다. 대문 옆에 설치된 청결통(화장실)을 활용하는 게 우리가 세운 탈출전략의 핵심이었다. 청결통 위로 올라가면 담을 넘을 수 있을 것 같았다. 평양에서 오신 양효숙 언니가 용기를 내 담을 넘었고 미리 준비해 둔 열쇠로 밖에서 대문을 열었다. 처음이 어렵지 성공하고 보니 별 것 아니었다. 다시 들어갈 때는 여러 사람이 떠받들어 한 사람이 담을 넘은 뒤 청결통 위에서 내부 상황을 확인하고 사감 선생님이 없을 때 잽싸게 안으로 들어갔다.
예배당 마루에 엎드려 개별기도를 하고 한 시간쯤 후 둘러앉아 예배를 드린 뒤 한 사람씩 돌아가며 기도를 했다. 회개 기도를 주로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 동지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시간이었다. 마음에 시험이 드는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 한마음으로 중보기도를 해줬다.
우리에게 이 시간은 영적으로 깨끗해지는 체험을 하는 순간이었다. 서로 고백하고 위로하고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기도공동체였다. 북한에 식구들을 두고 혼자 넘어온 학생들이 마음의 치유를 받는 기회이기도 했다.
기숙사 탈출과 진입 외에 큰 문젯거리는 역시 겨울철 추위였다. 내복이 변변치 않았던 터라 기도할 때마다 이가 바들바들 떨렸다. 우리는 추위를 버텨보려고 한 사람 위에 한 사람이 엎드리고, 그 위에 또 한 사람이 엎드려 서로의 체온과 몸무게를 감당해 보느라 안간힘을 썼다. 손끝까지 꽁꽁 얼어붙을 때쯤 기숙사 담장으로 향했다. 몸은 고달팠지만, 동무들 표정엔 슬픔이 전혀 없었다. 주의 길을 가는 이들이 겪는 잠깐의 고생일 뿐이라는 생각이 모두에게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인지 기도 후 담장 앞에 도착할 때면 항상 기숙사를 나올 때보단 그 높이가 낮게 느껴졌다.
정리=최기영 기자 ky710@kmib.co.kr
추위와 배고픔 이길 수 있었던 건 모든 게 주의 길 가는 이들이 겪는
잠시 동안의 고생일 뿐이라 생각
주선애 장로회신학대 명예교수(앞줄 오른쪽 세 번째)가 1950년쯤 장로회신학교 여학생, 교수님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남산 해방촌엔 유달리 북한 사람이 많이 살았다. 이북에서 피난 온 대학생들에게 무료로 숙식을 제공하는 ‘송죽원’이란 학사가 생겨 그곳에서 생활하게 됐다. 건물은 꽤 컸지만, 난방이 안 됐고 전기도 들어왔다 나가기를 반복했다. 한겨울에도 미군들이 쓰던 매트리스 한 개에 두 사람이 같이 누워 잤다. 너무 추워 견디기 힘들 때 조금 따뜻하게 자는 방법이 있었다. 두 사람이 등을 맞대고 반대로 누워 내 발은 옆 사람의 겨드랑이 밑에, 옆 사람의 발은 내 겨드랑이에 감싸고 자면 발에 따뜻한 기운이 돌아 잠이 잘 왔다.
장로회신학교 여학생들은 공부하느라 바빴다. 북한에선 영어를 배우지 못했는데 영어는 필수였고 헬라어 히브리어도 해야 하니 도통 정신이 없었다. 무료로 제공되는 식사는 아침저녁으로 나오는 죽 한 그릇이 전부였다. 영양 상태가 좋을 리 만무했다.
전기가 안 들어오는 밤에 공부하려면 빈 잉크병에 석유를 담아 솜이나 헝겊으로 심지를 만들어 불을 켰다. 그렇게 펄럭거리는 뿌연 불 밑에서 매트리스를 깔고 공부했다. 담요를 뒤집어쓰고 책을 읽노라면 졸음이 몰려와 꾸벅꾸벅 졸다가 불에 닿아 머리카락을 태우는 일도 다반사였다.
늘 허기지고 피곤한 상태였지만 피난민 여학생들은 금요일 저녁마다 6~7명씩 모여 철야기도를 했다. 기도처는 기숙사 인근 충무로교회였다. 기숙사는 밤 10시만 되면 사감 선생님의 점검이 있었다. 선생님의 최우선 임무는 10시 이후 아무도 나갈 수 없도록 커다란 대문을 굳게 잠그는 일이었다.
담장은 높고 육중한 대문은 안쪽에서 열 수 없게 잠겨 있었다. 사감 선생님의 점검이 끝난 후 몰래 모인 우리는 현관문 밖으로 나왔다. 대문 옆에 설치된 청결통(화장실)을 활용하는 게 우리가 세운 탈출전략의 핵심이었다. 청결통 위로 올라가면 담을 넘을 수 있을 것 같았다. 평양에서 오신 양효숙 언니가 용기를 내 담을 넘었고 미리 준비해 둔 열쇠로 밖에서 대문을 열었다. 처음이 어렵지 성공하고 보니 별 것 아니었다. 다시 들어갈 때는 여러 사람이 떠받들어 한 사람이 담을 넘은 뒤 청결통 위에서 내부 상황을 확인하고 사감 선생님이 없을 때 잽싸게 안으로 들어갔다.
예배당 마루에 엎드려 개별기도를 하고 한 시간쯤 후 둘러앉아 예배를 드린 뒤 한 사람씩 돌아가며 기도를 했다. 회개 기도를 주로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 동지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시간이었다. 마음에 시험이 드는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 한마음으로 중보기도를 해줬다.
우리에게 이 시간은 영적으로 깨끗해지는 체험을 하는 순간이었다. 서로 고백하고 위로하고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기도공동체였다. 북한에 식구들을 두고 혼자 넘어온 학생들이 마음의 치유를 받는 기회이기도 했다.
기숙사 탈출과 진입 외에 큰 문젯거리는 역시 겨울철 추위였다. 내복이 변변치 않았던 터라 기도할 때마다 이가 바들바들 떨렸다. 우리는 추위를 버텨보려고 한 사람 위에 한 사람이 엎드리고, 그 위에 또 한 사람이 엎드려 서로의 체온과 몸무게를 감당해 보느라 안간힘을 썼다. 손끝까지 꽁꽁 얼어붙을 때쯤 기숙사 담장으로 향했다. 몸은 고달팠지만, 동무들 표정엔 슬픔이 전혀 없었다. 주의 길을 가는 이들이 겪는 잠깐의 고생일 뿐이라는 생각이 모두에게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인지 기도 후 담장 앞에 도착할 때면 항상 기숙사를 나올 때보단 그 높이가 낮게 느껴졌다.
정리=최기영 기자 ky710@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