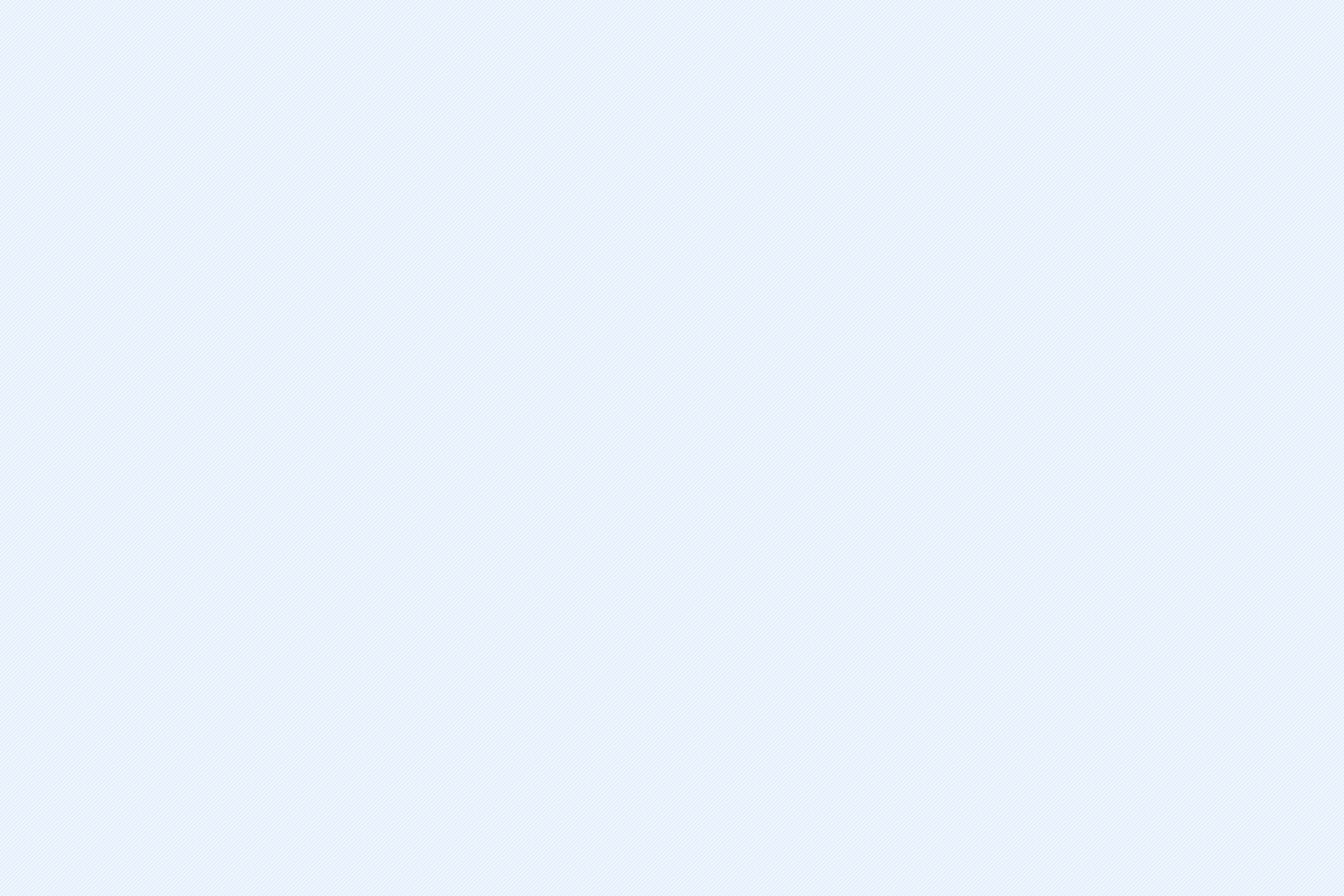주선애 교수 간증(9)
작성자
신영삼
작성일
2019-06-20 12:27
조회
89
풀려난 뒤 남쪽으로 향해 걷던 중 같은 처지의 안내자 일행과 합류… 추위와 배고픔 속에 필사의 탈출
주선애 장신대 명예교수가 월남한 후 만난 백부와 백모님이 1955년쯤 회갑연을 갖는 모습.
보안소에서 풀려난 뒤 남쪽을 향해 무조건 걸었다. 한참을 걷다 20여명의 사람들을 발견했다. 순간 멈칫했지만 행색을 보니 나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인 듯했다. 얘길 나눠보니 한 명의 안내자와 함께 남쪽으로 향하던 중이었다. 얼마나 고달픈 길을 가는지 알기에 자연스레 나를 그 무리에 들어가게 해 줬다.
안내자를 필두로 긴장감 속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여정이 이어졌다. 안내자가 20m쯤 앞장서 가보고 돌아와서 오라는 지시를 내리면 가고, 조금이라도 낌새가 불안하면 자리에 멈추길 반복했다. 장대비가 내리는 날에도 남쪽을 향한 전진은 멈추지 않았다. 안내자는 “빗소리는 이동하는 소리를 묻히게 해 매복한 군인들에게 들킬 확률이 낮기 때문에 좋은 기회”라며 사람들을 재촉했다.
온몸이 젖은 옷에 감싸여 점점 더 추워졌다. 미끄러운 산길을 지나다 발을 헛디뎌 벼랑에 떨어질 뻔했다. 나는 그 와중에 신발 한 짝이 벼랑 아래로 떨어져 한 발은 맨발이 된 채 걸어야 했다. 칡넝쿨에 걸리기 일쑤라 다리와 발은 상처투성이가 됐다. 종일 굶으며 이동하는 건 예삿일이었다. 안내자가 아는 어느 산골 집에 들를 땐 그나마 감자와 고구마를 먹으며 허기를 채울 수 있었다.
가장 위험한 관문인 38선에 가까워질수록 경비가 삼엄했다. “피차 말하지 마시오. 낮엔 꼼짝말고 기다리시오. 행진하는 밤에는 안내자를 소리 없이 따라오시오.” 안내자는 거듭 주의를 줬다. 목숨이 걸린 모험이니 극도의 긴장감에 입술이 연신 떨렸다. 그래도 서울이 가까워진다는 생각에 넘어지고 미끄러져도 말없이 따라갔다. 행진이 계속되던 어느 날 안내자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제 넘어왔습니다.”
우리 일행은 너나 할 것 없이 “만세”라고 외쳤다. 몇몇 기독교인들은 연신 “할렐루야”를 부르짖었다. 산 밑에선 남쪽 사람들이 피난민을 위한 주먹밥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웃음 짓는 아주머니들의 손길과 마음이 그토록 아름다울 수 없었다.
남한 기차를 타고 청량리역으로 향했다. 드디어 서울에 도착했다. 무일푼이었던 나는 백부 주요남 장로님 댁을 찾아 청량리에서 을지로까지 걸었다. 겨우 집을 찾아 현관문을 열자 백부님과 육촌 형제들이 반겨줬다. 평양을 떠난 지 12일 만에 만난 혈육이었다. 이제 염려는 어머니와 남편이었다. 바다로 오기로 했는데 풍랑을 만나진 않았는지, 보안원에게 붙잡히진 않았는지 걱정됐다.
약속대로 매일 남산에 올라가 두리번거리며 초조히 기다리다 기도를 하고 내려오곤 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3~4일 후에 가족들을 만났다. 서로 부둥켜안고 “할렐루야”를 외쳤다. 이제 가족들이 머물 곳을 걱정해야 했다. 백부님 댁에선 우리 식구가 생활할 공간이 도저히 나오질 않았다. 이런 상황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손길을 낯선 서울 길에서 만날 수 있었다. 남편이 평양 동광교회에서 사역하던 시절 그 교회에 다니던 권사님을 만난 것이다. 권사님은 서울 마포에 집을 갖고 있었는데 마당도 있고 방도 많았다.
“우리 집엔 내외만 살고 있어요.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저희 집으로 가족들을 모시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감격스러울 따름이었다. 우리 식구는 아무 짐도 없이 그 집으로 이사를 갔다. 기본적인 살림 도구를 사다 놓고 마포 동막교회에 나가 봉사하며 남산 장로회신학교 편입 수속을 준비했다.
정리=최기영 기자 ky710@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84087&code=23111513&cp=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