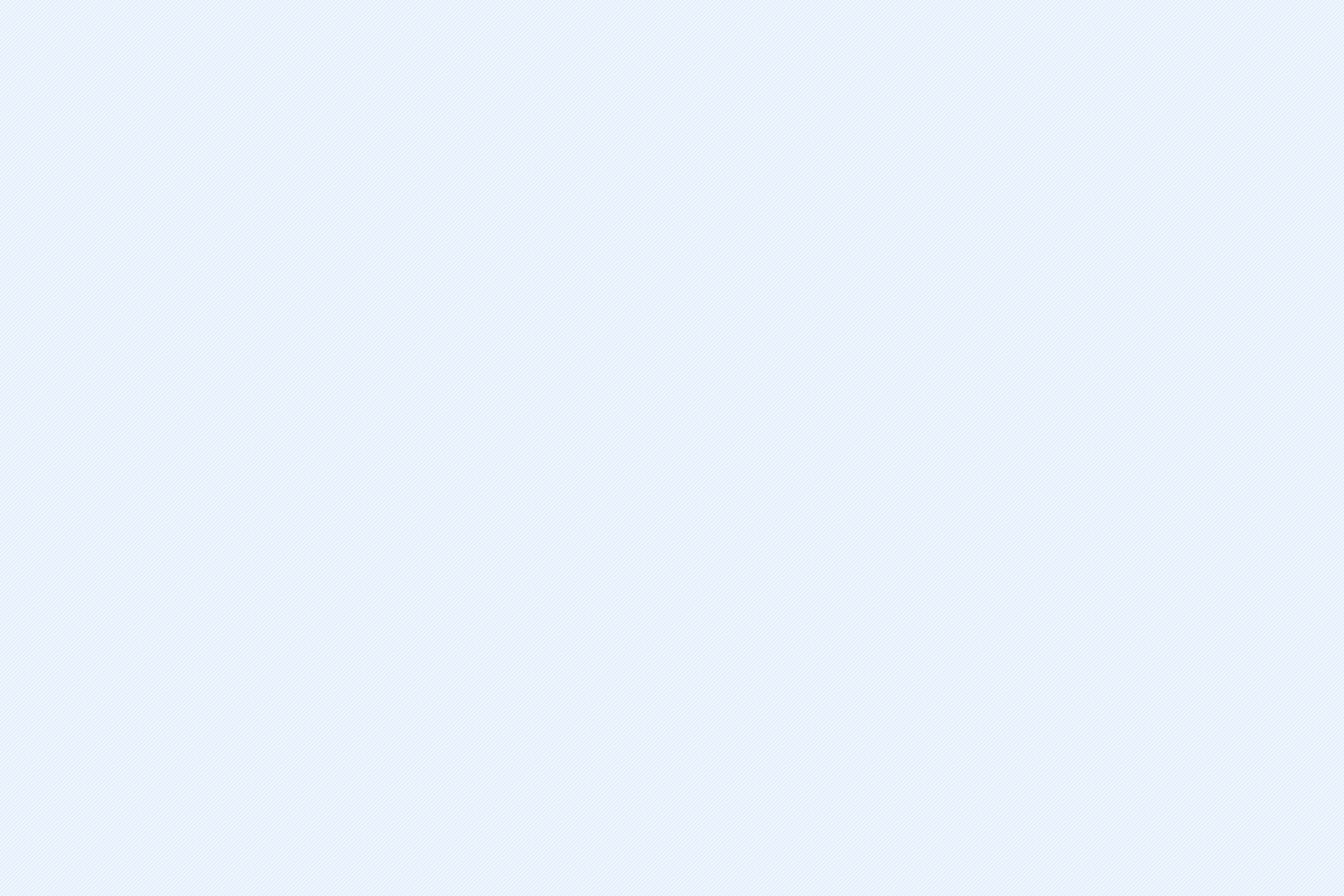어느 변호사의 글
작성자
신영삼
작성일
2020-02-24 15:37
조회
102
천길 절벽 위에서 흘리는 눈물
 엄상익(변호사)
엄상익(변호사) 경기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 능력이 비상하던 한 친구가 있었다.
보통 아이들이 영어, 수학 공부 등 대학입시를 향해 달려갈 때 그는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에 탐닉하고 있었다.
그는 손재주도 좋았다. 크리스마스 때면 내 방에 와서 성탄 카드도 직접 그려주었다. 그가 색연필을 쥐고 하얀 종이 위에 대면
그 순간 눈 덮인 초가집도 생기고 아름다운 오솔길도 나타났다. 그 시절 명문이라고 불리던 경기고등학교에 다닌다고 하면
세상은 부자나 권세가인 부모를 만난 속칭 금수저로 간주하기도 했다. 실제로 그런 친구들이 많았다.
어느 날 그가 내게 이런 고백을 했다.
“내가 여섯 살 때였어. 엄마가 손을 잡고 나를 시장에 데리고 갔어. 그런데 이것저것 구경을 하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엄마가 없는 거야.
“내가 여섯 살 때였어. 엄마가 손을 잡고 나를 시장에 데리고 갔어. 그런데 이것저것 구경을 하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엄마가 없는 거야.
어린아이였던 나는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지. 진땀을 흘리면서 온몸으로 울고 있었어. 그 앞에 작은 양복점이 있었는데 그 집 아저씨가 딱한지 한참을 보다가 나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어. 엄마가 나를 시장에 갔다가 버리고 도망간 거야. 양복점 주인아저씨는 밥을 먹이고 나를 하룻밤 재웠어. 그런데 그 아저씨는 나를 경찰에 신고해서 고아원으로 보내지 않고 다음 날부터 양복점 심부름꾼으로 썼어. 그때부터 잔심부름을 하면서 양복점 일을 배웠어. 실을 감기도 하고 가위질을 하기도 했지.”
그렇게 어린 자식을 버리기도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의 다음 말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 집에서 밥을 얻어먹고 일을 했는데 그 집 아저씨는 나를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보내줬어. 중학교를 다닐 때였지.
그렇게 어린 자식을 버리기도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의 다음 말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 집에서 밥을 얻어먹고 일을 했는데 그 집 아저씨는 나를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보내줬어. 중학교를 다닐 때였지.
양복점에서 재단을 하면서 학교를 다녔는데 영어나 수학 공부가 너무 재미있는 거야. 중학교 이학년 때부터 계속 전교 일등을 했어.
담임선생님은 한번 경기고등학교에 원서를 내보라고 했어. 그렇게 합격을 하고 경기고등학교로 온 거지.
양복점 주인아저씨가 이놈 제법이네 하고 고등학교로 보내줬어.”
그렇게 머리가 비상하고 똑똑한 아이를 그 엄마는 왜 그런 식으로 버렸을까?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을까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렇게 머리가 비상하고 똑똑한 아이를 그 엄마는 왜 그런 식으로 버렸을까?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을까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 친구는 대학입시가 치열했던 그 시절 고등학교 3학년이 됐어도 제대로 공부할 시간이 없는 것 같았다. 말은 안 하지만 밥을 얻어먹고 일을 했던 양복점 집 아이들의 시기와 질투도 짐작이 갔다. 입시학원과 과외를 많이 하던 그 시절 그는 경쟁력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도 그는 서울대학교는 가지 못했지만 명문대에 거뜬히 합격했다.
그는 일 년 간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었다면 서울대에 갈 수 있었을 거라고 말했다. 그는 문학전공이었다.
그는 일 년 간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었다면 서울대에 갈 수 있었을 거라고 말했다. 그는 문학전공이었다.
교수들은 그에게 천재성이 있다고 했다. 나는 그가 노벨문학상 후보쯤 되는 뛰어난 작가가 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역시 현실은 그에게 뛰어넘을 수 없는 높고 두꺼운 벽이었다. 그는 먹고 살기 위해 기자가 됐다. 그리고 일생을 언론인으로
지내면서 신문의 문화면을 담당했다. 그는 정년퇴직을 하고 오랫동안 우즈베키스탄 지역의 한글 선생으로 가서 봉사하고 있다.
나는 그와 만나 밥을 먹을 때마다 그의 앞에 놓인 맑고 투명한 소주가 담긴 잔의 반은 그의 눈물이 섞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힘든 환경에서도 잘 자란 맑은 영혼을 가진 친구들이 주변에는 많았다. 나와 제일 친한 또 다른 한 친구는 여덟 살 때 엄마가 죽었다. 아버지는 재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았다. 전처 자식이 된 그는 초등학교 때부터 외톨이였다.
힘든 환경에서도 잘 자란 맑은 영혼을 가진 친구들이 주변에는 많았다. 나와 제일 친한 또 다른 한 친구는 여덟 살 때 엄마가 죽었다. 아버지는 재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았다. 전처 자식이 된 그는 초등학교 때부터 외톨이였다.
새로 형성된 집안에서 그는 이방인이었는지도 모른다. 중학교 시절 그는 혼자 공부에 전념했던 것 같다. 경기고등학교에서 그를 만났고 같은 법대에서 그와 같이 공부를 했다. 그는 집념 그 자체였다. 열이 펄펄 끓어도 그는 도서관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해마다 한 번씩 있었던 사법고시가 끝나고 마포에 있는 그의 작은 하숙방에 간 적이 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삼십 명 가량의 고시 합격자 명단이 있는 일간지가 놓여 있었다. 그 명단의 끝에 낙방한 그의 이름이 볼펜으로 적혀 있었다. 나나 그나 그렇게 되고 싶었다.
“나 합격했다.”
그가 공허한 웃음을 지으면서 내게 말했다. 그 다음 해 그는 진짜 합격을 했다. 그는 길거리에 주저앉아서 펑펑 울었다고 내게 말했다. 그는 재혼한 아버지의 새 가정에 끼지 못하고 외곽에서 혼자서 춥고 쓸쓸하게 살아왔던 게 서러웠던 것 같았다.
“나 합격했다.”
그가 공허한 웃음을 지으면서 내게 말했다. 그 다음 해 그는 진짜 합격을 했다. 그는 길거리에 주저앉아서 펑펑 울었다고 내게 말했다. 그는 재혼한 아버지의 새 가정에 끼지 못하고 외곽에서 혼자서 춥고 쓸쓸하게 살아왔던 게 서러웠던 것 같았다.
그는 법관으로 평생을 보내고 지금은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다. 사람마다 살아가면서 천길 절벽 위에서 눈물을 흘릴 일이 많다.
나는 그 눈물들이 보석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한다. 눈에 눈물이 없으면 그 영혼에 무지개가 없기 때문이다.